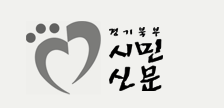‘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년 9월 5일 개봉된 영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영상물이다. 이 영화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란 제목이다. 프로젝트는 다의어이나, 통상적으로는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또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제목으로 영화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천안함 사건은 누군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도(企圖)임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영화의 내용은 제목에서 유추되는 것 그대로이다. 비록 영화는 21,000여 명의 관객 수를 남긴 채 대중들에게서 잊혔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46용사 등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재조명함이 공허한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영화를 논함에 가장 먼저 언급할 내용은 이 영화의 표리부동적 측면이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영화’라고 했다. 하지만 영화는 75분 내내 천안함이 좌초 혹은 단순 침몰되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을 조명할 뿐, 합동조사로 밝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폭침’이란 사실에 대하여는 어떤 언급도 없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천안함 음모론자 2명의 입장만을 다룸으로써, 천안함 폭침은 의도적으로 날조되었다는 편향된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지 않았나 싶다.
다음의 논점은 이 영화의 비인도적 측면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46용사의 생명을 앗아갔고, 58인의 장병에게 평생 잊기 힘든 정신적 외상을 남겼다. 특히 46용사의 유족 상처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상처가 국가수호의 과정에서의 명예로운 희생 또는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용사와 그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하는 아픔이 진하게 남는다.
이 영화의 마지막 논점은 對국가적 파급력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도발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치단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국론의 분열과 북한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야기했다. 비록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에게서 잊혔지만, 서점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도서가 진열되어 있고, 온라인상에는 국민을 선동하고 희생자들을 괴롭히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들이 일단의 음모론자들에 의해 퍼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천안함을 좌초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진심으로 깨달아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46용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